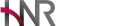반 쪽 짜리 중국고섬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럴 듯하게 포장된 증권신고서에 현혹되어 A라는 회사의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공모 직후 당해 증권신고서가 허위기재로 판명되어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 “갑 ”이 있다 . 그리고 , “갑 ” 옆에는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 허위기재된 증권신고서에 기하여 발행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허위기재가 드러나 동일하게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 “을 ”이 있다 . 갑과 을 사이에 손해배상을 달리 부여할 이유가 존재할까 ?
말 많고 탈 많던 중국고섬 사태로 촉발된 소송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났다 . 그러나 , 투자자들의 고민은 오히려 더욱 깊어진 듯 하다 . 그 동안 중국고섬 투자자들은 근 3년간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된 중국고섬 주식 (정확히는 주식예탁증권 )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려 왔다 . 피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여되는 등 소송이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 결국 1심 법원은 근거 법령을 좁게 해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범위를 예상보다 크게 제한하였다 .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심어주어 차이나디스카운트 (China Discount)의 대명사로 불리는 중국고섬은 지난 2011. 1. 주식예탁증권 (DR)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한국 증시에 상장하였다 . 그러나 상장 2개월 만에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져 거래가 정지된 후 며칠 뒤 중국고섬 자회사가 갖고 있던 은행예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 후 2년 반여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 정리매매를 거친 후 2013. 10. 마침내 중국고섬을 한국 증시에서 상장폐지하였다 .
중국고섬 투자자들은 IPO 과정에서 예금의 부존재 등 증권신고서상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 주간사 증권사인 대우증권과 한국거래소 , 한영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2011. 9. 부실상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1심 판결이다 .
투자자 보호를 주요 제정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제 125조에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로 “증권의 취득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특별히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취득한 자 ,” 즉 , 공모시장에서 취득한 최초 취득자와 그 이후의 취득자 (전득자 )를 따로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을 보호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최초 취득자와 그 이후의 전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증권의 취득자 ”라로 표기하는 포괄적 표기방식을 통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증권의 취득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근간이 된 미국의 증권법 역시 관련 조항에서 최초 취득자와 전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증권을 매입한 자 (any person acquiring such security)라고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다만 , 판례를 통해 허위기재된 증권신고서에 기하여 발행된 증권의 매입자로 취득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any person who purchased stock under registration statement at issue)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그러나 , 중국고섬 사건의 1심 법원은 이와 사뭇 다른 해석을 하였다 . 즉 , 자본시장법 제 125조 제 1항 단서 중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 ”라고 규정된 문언이 증권의 발행 절차를 상정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서로 구분되어 공시책임 및 책임 요건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 자본시장법 제 125조의 “증권의 취득자 ”는 오로지 공모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최초 취득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 이로 인해 , 전체 원고 550명 중 공모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425명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외되고 말았다 . 앞의 예에서 을을 제외한 갑에게만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된 것이다 .
물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공모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과거의 대법원판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하지만 대법원은 그 이후 “구 증권거래법 제 14조 (자본시장법 제 125조에 해당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 ’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을 사실상 변경하였고 , 그 후 이를 재확인하기까지 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 92336).
이번 중국고섬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보호대상이 된 투자자들이 정작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 자본시장법 체계에 와서 제외되게 되는 셈이다 . 1심 판결에 실망한 중국고섬 투자자들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상급심에서 갑과 을이 모두 배상을 받을지 여전히 갑에게만 배상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사건이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번에야 말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말 많고 탈 많던 중국고섬 사태로 촉발된 소송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났다 . 그러나 , 투자자들의 고민은 오히려 더욱 깊어진 듯 하다 . 그 동안 중국고섬 투자자들은 근 3년간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된 중국고섬 주식 (정확히는 주식예탁증권 )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려 왔다 . 피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여되는 등 소송이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 결국 1심 법원은 근거 법령을 좁게 해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범위를 예상보다 크게 제한하였다 .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심어주어 차이나디스카운트 (China Discount)의 대명사로 불리는 중국고섬은 지난 2011. 1. 주식예탁증권 (DR)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한국 증시에 상장하였다 . 그러나 상장 2개월 만에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져 거래가 정지된 후 며칠 뒤 중국고섬 자회사가 갖고 있던 은행예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 후 2년 반여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 정리매매를 거친 후 2013. 10. 마침내 중국고섬을 한국 증시에서 상장폐지하였다 .
중국고섬 투자자들은 IPO 과정에서 예금의 부존재 등 증권신고서상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 주간사 증권사인 대우증권과 한국거래소 , 한영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2011. 9. 부실상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1심 판결이다 .
투자자 보호를 주요 제정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제 125조에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로 “증권의 취득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특별히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취득한 자 ,” 즉 , 공모시장에서 취득한 최초 취득자와 그 이후의 취득자 (전득자 )를 따로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을 보호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최초 취득자와 그 이후의 전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증권의 취득자 ”라로 표기하는 포괄적 표기방식을 통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증권의 취득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근간이 된 미국의 증권법 역시 관련 조항에서 최초 취득자와 전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증권을 매입한 자 (any person acquiring such security)라고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다만 , 판례를 통해 허위기재된 증권신고서에 기하여 발행된 증권의 매입자로 취득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any person who purchased stock under registration statement at issue)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그러나 , 중국고섬 사건의 1심 법원은 이와 사뭇 다른 해석을 하였다 . 즉 , 자본시장법 제 125조 제 1항 단서 중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 ”라고 규정된 문언이 증권의 발행 절차를 상정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서로 구분되어 공시책임 및 책임 요건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 자본시장법 제 125조의 “증권의 취득자 ”는 오로지 공모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최초 취득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 이로 인해 , 전체 원고 550명 중 공모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425명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외되고 말았다 . 앞의 예에서 을을 제외한 갑에게만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된 것이다 .
물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공모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과거의 대법원판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하지만 대법원은 그 이후 “구 증권거래법 제 14조 (자본시장법 제 125조에 해당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 ’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을 사실상 변경하였고 , 그 후 이를 재확인하기까지 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 92336).
이번 중국고섬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보호대상이 된 투자자들이 정작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 자본시장법 체계에 와서 제외되게 되는 셈이다 . 1심 판결에 실망한 중국고섬 투자자들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상급심에서 갑과 을이 모두 배상을 받을지 여전히 갑에게만 배상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사건이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번에야 말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개정 외부감사법, 소송지연 초래해 투자자보호 후퇴할 듯 14.01.29
- 다음글페이스북(Facebook)의 공모가 뻥튀기, 결국 재판으로.. 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