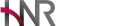선진국의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 영국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의 실제 운용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를 실제로 도입한 영국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품인 ELS와 관련하여 문제된 바 있는 구조화채권의 기초자산 종가조작사건에 대한 배상명령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1. 10. 17. 영국의 금융감독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구조화채권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구조화채권의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를 조작한 투자자에게 손실회피금액 (미화 3,103,640달러)의 2.1배에 해당하는 벌금 (미화 6,517,600달러)과 손실회피금액 전액 (미화 3,103,640달러) 상당의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주가조작을 한 투자자는 원래 영국의 2000년 금융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손실회피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사 초기에 자진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30%를 감면받아 결국 손실회패금액의 2.1배가 부과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와는 별도로 부과된 배상명령이다. 주가조작을 한 투자자는 벌금과는 별도로 손실회피금액 전액을 피해를 당한 금융기관에게 배상하도록 명하여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인도인 사업가인 고엔카(Goenka)씨는 2007. 10. 17. 1천만불을 투자하여 3년 만기 구조화채권을 매수하였다. 이 구조화채권의 수익률은 구조화채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종목들(Reliance Industries, ICICI Bank 및 HDFC Bank)의 성과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었다. 계약에 따르면, 만기일에 각 구조화채권의 기초자산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결정되면 당해 종목의 성과에 따라 고엔카씨가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만기일 종가가 설정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액면가에 더해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프리미엄으로 지급되고, 만기일 종가가 기준가격(Knock-In 가격)보다는 높지만 설정일 종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만이 지급되고, 기준가격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채권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 특히 만기일에 근접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추이가 기준가격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주가조작을 통하여 만기 채권 상환액을 크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종가 1 tick 차이가 손실과 이익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고엔카씨도 마찬가지였다. 구조화채권의 만기일인 2010. 10. 18.에 다가올수록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종목 중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은 Reliance Industries의 가격이 기준가격인 48.65불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일 오전에는 시가(始價)가 47.2불로 기준가격보다 1.45불이나 낮아서, 그대로 장이 마감된다면 손실이 자명한 상황이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엔카씨는 브로커를 통하여 종가가 결정되는 동시매매시간대(장마감 10분전부터 장마감시까지를 일컬으며 10분간 접수되는 주문을 한데모아 한꺼번에 체결시키게 되고, 그 체결가격이 당일의 종가로 결정됨)에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넣도록 하여 결국 48.71불, 즉, 아주 근소한 차이(6센트)로 Reliance Industries의 만기일 종가를 기준가 보다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주가조작을 통하여 끌어올린 가격은 그 다음날 바로 47.1불까지 떨어졌고, 주가조작을 위해 대량 매수한 Reliance Industries는 그 후 수일에 걸쳐 매도하며 처분손실도 최소화하였다). 결국, 주가조작으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가격보다 6센트 높이는데 성공한 고엔카씨는 주가조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상환 받았을 6,896,360불 대신 채권액면가 1천만불 전부를 상환받게 되었고, 반대로 계약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3,103,640불(10,000,000-6,896,360)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혐의가 영국 금융감독청에 의해 포착되었고 그 후 금융감독청의 조사를 거쳐 결국 벌금과 배상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행위, 즉 기초자산의 종가조작이 있은 날짜가 2010. 10. 18.이고 금융감독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2011. 10. 17.이므로 정확히 1년 만에 벌금과 배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인 ELS종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9년이었는데 그 후 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의 유무를 둘러싸고 민사재판이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이 ELS의 종가조작혐의를 인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또 검찰에 통보를 하였으나 제재조치는 경미했고 배상명령도 내려지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약 영국식의 배상명령제도가 있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제한된 증거자료와 자원을 갖고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대신 금융감독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발령하여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지난 2011. 10. 17. 영국의 금융감독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구조화채권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구조화채권의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를 조작한 투자자에게 손실회피금액 (미화 3,103,640달러)의 2.1배에 해당하는 벌금 (미화 6,517,600달러)과 손실회피금액 전액 (미화 3,103,640달러) 상당의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주가조작을 한 투자자는 원래 영국의 2000년 금융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손실회피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사 초기에 자진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30%를 감면받아 결국 손실회패금액의 2.1배가 부과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와는 별도로 부과된 배상명령이다. 주가조작을 한 투자자는 벌금과는 별도로 손실회피금액 전액을 피해를 당한 금융기관에게 배상하도록 명하여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인도인 사업가인 고엔카(Goenka)씨는 2007. 10. 17. 1천만불을 투자하여 3년 만기 구조화채권을 매수하였다. 이 구조화채권의 수익률은 구조화채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종목들(Reliance Industries, ICICI Bank 및 HDFC Bank)의 성과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었다. 계약에 따르면, 만기일에 각 구조화채권의 기초자산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결정되면 당해 종목의 성과에 따라 고엔카씨가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만기일 종가가 설정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액면가에 더해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프리미엄으로 지급되고, 만기일 종가가 기준가격(Knock-In 가격)보다는 높지만 설정일 종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만이 지급되고, 기준가격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채권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 특히 만기일에 근접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추이가 기준가격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주가조작을 통하여 만기 채권 상환액을 크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종가 1 tick 차이가 손실과 이익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고엔카씨도 마찬가지였다. 구조화채권의 만기일인 2010. 10. 18.에 다가올수록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종목 중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은 Reliance Industries의 가격이 기준가격인 48.65불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일 오전에는 시가(始價)가 47.2불로 기준가격보다 1.45불이나 낮아서, 그대로 장이 마감된다면 손실이 자명한 상황이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엔카씨는 브로커를 통하여 종가가 결정되는 동시매매시간대(장마감 10분전부터 장마감시까지를 일컬으며 10분간 접수되는 주문을 한데모아 한꺼번에 체결시키게 되고, 그 체결가격이 당일의 종가로 결정됨)에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넣도록 하여 결국 48.71불, 즉, 아주 근소한 차이(6센트)로 Reliance Industries의 만기일 종가를 기준가 보다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주가조작을 통하여 끌어올린 가격은 그 다음날 바로 47.1불까지 떨어졌고, 주가조작을 위해 대량 매수한 Reliance Industries는 그 후 수일에 걸쳐 매도하며 처분손실도 최소화하였다). 결국, 주가조작으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가격보다 6센트 높이는데 성공한 고엔카씨는 주가조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상환 받았을 6,896,360불 대신 채권액면가 1천만불 전부를 상환받게 되었고, 반대로 계약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3,103,640불(10,000,000-6,896,360)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혐의가 영국 금융감독청에 의해 포착되었고 그 후 금융감독청의 조사를 거쳐 결국 벌금과 배상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행위, 즉 기초자산의 종가조작이 있은 날짜가 2010. 10. 18.이고 금융감독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2011. 10. 17.이므로 정확히 1년 만에 벌금과 배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인 ELS종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9년이었는데 그 후 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의 유무를 둘러싸고 민사재판이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이 ELS의 종가조작혐의를 인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또 검찰에 통보를 하였으나 제재조치는 경미했고 배상명령도 내려지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약 영국식의 배상명령제도가 있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제한된 증거자료와 자원을 갖고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대신 금융감독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발령하여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우리투스타 KW-8호 투자자들의 전액 승소판결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14.02.14
- 다음글영국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