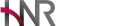미연방대법원, 옴니케어사 관련 집단소송사건 본격 심리하기로 결정
지난 2014. 3. 3. 미연방대법원은 미국 최대의 조제전문 약국체인인 옴니케어(Omnicare)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집단소송에 관하여 제6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허가하였다 (writ of certiorari). 미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허가되는 비율은 불과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컨대, 2010년의 경우 총 8,159건의 접수사건 중 상고가 허가된 사건은 87건에 불과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이 옴니케어사건에 관한 상고를 허가한 것은 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Section 11의 해석에 관하여 연방 항소법원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옴니케어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어떤 쟁점이 있길래 미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하게 된 것일까.
옴니케어사는 미국 최대의 조제전문 약국체인으로서 2005. 12. 15. 공모를 통해 약 1천3백만주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발행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는 옴니케어가 제약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이 ‘합법적이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옴니케어는 제약제조업체들과 불법적인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하고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de)에 허위 청구서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증권신고서 기재가 허위라는 것이다.
공모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들은 옴니케어 및 옴니케어 이사들이 증권신고서에 법규 준수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0(b)와 Rule 10b-5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2.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소장에 실제 이사들이 그러한 허위표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 Section 10(b)과 Rule 10b-5에 묻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증권신고서 허위표시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1933년 증권법 Section 11의 위반을 추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인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은 재차 피고의 허위표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주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법원인 제6 항소법원은 2013. 3. 23. 1심판결을 뒤집고 옴니케어의 소송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거절하여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옴니케어는 이에 불복하여 미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제6 항소법원은 증권거래법 Section 10(b)와 Rule 10b-5가 포괄적 ‘사기’규정으로서 이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고의(scienter)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증권법 Section 11에 따른 소송의 경우는 다르다고 보았다. 즉, 증권신고서상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당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허위표시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는 주장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동조항 단서에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허위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여타 전문가나 인수인에 대해서는 책임면제조항이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결국, 이러한 해석은 증권신고서 허위표시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와 회사의 이사들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6 항소법원의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1983년 Huddleston 판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당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동 규정을 해석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책임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허위표시에 대하여 무지한(innocent)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증권신고서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2 및 제9 항소법원은 허위로 기재된 의견이 증권법 Section 11의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허위성 외에 주관적 허위성, 즉,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역시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Fait v. Regions Financial Corp). 그런데 이러한 판결들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1991년 Sandberg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증권거래법 Section 14를 해석하면서, ‘의견이나 믿음의 표시는 표시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표시자의 진정한 믿음이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설시함으로써, 법규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같이 의견이나 믿음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자가 주관적으로 표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던 것이다.
옴니케어사건에서 제6 항소법원은 Sandberg 사건이, 허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관적 허위성, 즉, 피고가 표시된 바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본 사안과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증권법 Section 11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증권거래법 Section 14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제2 및 제9 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너무 앞서 갔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제6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고가 허가됨에 따라 증권법 Section 11의 해석상 엄격책임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1933년 증권법 Section 11와 같은 취지를 자본시장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다. 옴니케어사건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의견이나 판단을 포함하는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허위성에 대한 피고들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시할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과연 옴니케어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어떤 쟁점이 있길래 미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하게 된 것일까.
옴니케어사는 미국 최대의 조제전문 약국체인으로서 2005. 12. 15. 공모를 통해 약 1천3백만주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발행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는 옴니케어가 제약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이 ‘합법적이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옴니케어는 제약제조업체들과 불법적인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하고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de)에 허위 청구서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증권신고서 기재가 허위라는 것이다.
공모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들은 옴니케어 및 옴니케어 이사들이 증권신고서에 법규 준수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0(b)와 Rule 10b-5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2.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소장에 실제 이사들이 그러한 허위표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 Section 10(b)과 Rule 10b-5에 묻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증권신고서 허위표시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1933년 증권법 Section 11의 위반을 추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인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은 재차 피고의 허위표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주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법원인 제6 항소법원은 2013. 3. 23. 1심판결을 뒤집고 옴니케어의 소송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거절하여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옴니케어는 이에 불복하여 미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제6 항소법원은 증권거래법 Section 10(b)와 Rule 10b-5가 포괄적 ‘사기’규정으로서 이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고의(scienter)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증권법 Section 11에 따른 소송의 경우는 다르다고 보았다. 즉, 증권신고서상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당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허위표시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는 주장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동조항 단서에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허위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여타 전문가나 인수인에 대해서는 책임면제조항이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결국, 이러한 해석은 증권신고서 허위표시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와 회사의 이사들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6 항소법원의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1983년 Huddleston 판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당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동 규정을 해석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책임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허위표시에 대하여 무지한(innocent)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증권신고서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2 및 제9 항소법원은 허위로 기재된 의견이 증권법 Section 11의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허위성 외에 주관적 허위성, 즉,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역시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Fait v. Regions Financial Corp). 그런데 이러한 판결들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1991년 Sandberg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증권거래법 Section 14를 해석하면서, ‘의견이나 믿음의 표시는 표시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표시자의 진정한 믿음이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설시함으로써, 법규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같이 의견이나 믿음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자가 주관적으로 표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던 것이다.
옴니케어사건에서 제6 항소법원은 Sandberg 사건이, 허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관적 허위성, 즉, 피고가 표시된 바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본 사안과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증권법 Section 11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증권거래법 Section 14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제2 및 제9 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너무 앞서 갔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제6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고가 허가됨에 따라 증권법 Section 11의 해석상 엄격책임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1933년 증권법 Section 11와 같은 취지를 자본시장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다. 옴니케어사건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의견이나 판단을 포함하는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허위성에 대한 피고들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시할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금융위, 플랜트건설부문 손실 은폐한 GS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14.04.15
- 다음글케이디미디어 사례를 통해 본 BW 꺾기와 실태와 문제점 14.04.01